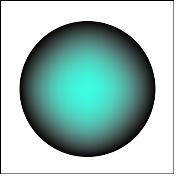第二章 無 極 論
本稿(본고)에서 宇宙論(우주론)을 展開(전개)함에 있어서 使用(사용)된 用語(용어)들중 생소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旣存(기존)의 用語(용어)와 意味上(의미상) 區別(구별)되는 것도 있다. 그런데, 이는 旣存(기존)의 哲學(철학)이 손대지 못한 未開拓(미개척) 分野(분야)이기에, 이를 定立(정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用語(용어)의 導入(도입)이 不可避(불가피)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旣存(기존)의 用語(용어)들은 그 槪念(개념)이 明確(명확)하지 못하여 昏亂(혼란)의 所持(소지)가 多分(다분)하기 때문에 다시금 用語定義(용어정의)를 한 것도 저지 않다. 이와같은 正名作業(정명작업)에 있어서 可及的(가급적)이면 旣存(기존)의 用語(용어)를 살리는 方向(방향)으로 努力(노력)하였으나 不可避(불가피)한 것은 새로이 正名(정명)하여 使用(사용)하였음을 일러 둔다.
無極(무극)이라는 用語(용어)는 朱子(주자)의《太極圖說(태극도설)》에 처음으로 登場(등장)한다. 朱子(주자)는「無極而太極(무극이태극)」라는 表現(표현)을 使用(사용)하여 太極(태극)과의 區別(구별)을 꾀하였다.
‘太極(태극)’이라는 用語(용어)는 原來(원래),《易(역).繫辭(계사)》의 “易有太極(역유태극), 是生兩儀(시생양의), 兩儀生四象(양의생사상), 四象生八卦(사상생팔괘)”에서 由來(유래)한 것으로, 周易(주역)의 精髓(정수)이며 나아가 東洋哲學(동양철학)의 根幹(근간)이 되어 왔다.
原來(원래), ‘太(태)’子(자)는 古代(고대)의 數學(수학)에 있어서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無限數(무한수)를 表示(표시)할 때 使用(사용)하였는 바, ‘太極(태극)’이란 곧 無窮無盡(무궁무진)하고 寂寞無朕(적막무짐)한 玄玄境(현현경)의 뜻을 內包(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哲學(철학)이 發展(발전)함에 따라 形而上(형이상)의 領域(영역)이었던 太極(태극)을 硏究(연구)하게 되었고 나름대로의 體系(체계)를 잡게 된 것이다. 즉, 몇몇 太極說(태극설)의 出現(출현)과 더불어 ‘太極(태극)’은 無窮無盡(무궁무진)의 意味(의미)에서 脫皮(탈피)하여 좀 더 具體的(구체적)인 對象(대상)으로 認識(인식)되기 始作(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다시금 太極(태극) 以前(이전)의 形而上(형이상)의 段階(단계)를 設定(설정)할 必要(필요)가 생기게 되었고, 이런 趣旨(취지)로 朱子(주자)가 ‘無極論(무극론)’을 提唱(제창)하게 된 것이다.
朱子(주자)의「無極而太極(무극이태극)」을 無極(무극)과 太極(태극)이 同一(동일)하다는 뜻으로, 또한「太極本無極(태극본무극)」을 ‘太極(태극)은 本來(본래) 無極(무극)과 同一(동일)하다’는 式(식)으로 各各(각각) 解釋(해석)하여, 無極(무극)과 太極(태극)을 같은 槪念(개념)으로 使用(사용)하는 學者(학자)가 적지않는데, 이는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無極而太極(무극이태극)」에서 ‘而(이)’는 곧 ‘繼承(계승)’의 意味(의미)로서, 無極(무극)에서 太極(태극)으로 發展(발전)하였다는 뜻이다. 또한「太極本無極(태극본무극)」에서의 ‘本(본)’은 形容詞(형용사)가 아닌 ‘바탕을 둔다’라는 動詞(동사)로 使用(사용)된 것으로, 太極(태극)은 無極(무극)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意味(의미)인 것이다. 그런즉, 無極(무극)은 太極(태극)과 同一(동일)한 槪念(개념)이 아니며, 太極(태극) 以前(이전)의 段階(단계)를 指稱(지칭)하는 것이다.
却說(각설)하고, 旣存(기존)의 無極(무극)에 대한 槪念(개념)이 如何(여하)하건 本稿(본고)에서는 宇宙發展(우주발전) 過程(과정)의 한 段階(단계)로서 無極(무극)의 槪念(개념)을 設定(설정)하고자 한다.
淸淨統一體(청정통일체)인 太一(태일)에 靜(정), 氣(기)의 不均衡(불균형)에 의한 極微動(극미동)이 反起(반기)하였을 때, 瞬間的(순간적)으로 自身(자신)의 自存性(자존성)을 잃어버리는 狀態(상태)가 있었음인데, 이 位(위)를 이름하여 無極(무극)이라 함이다.
그렇다면, 存在性(존재성)을 잃어버리는 狀態(상태)란 果然(과연) 무엇을 뜻함인가?
太一(태일)을 봄을 見性(견성)이라 하며, 太一(태일)과 一體(일체)됨을 成佛(성불)이라 하며, 太一(태일)을 自由(자유)로이 넘나들 수 있음을 菩薩(보살), 神仙(신선), 道通神(도통신)이라 한다. 見性(견성)즉 成佛(성불)이 아니다. 見性(견성)을 하였다고 반드시 成佛(성불)하는 것은 아니다. 太一(태일)을 한 번 본즉 眞我(진아)가 곧 太一(태일)임을 알고 自身(자신)의 本體(본체)가 永遠(영원)하다는 事實(사실)을 覺(각)하게는 된다. 또한, 太一(태일)과 有(유), 無(무), 空(공), 虛(허)의 槪念(개념)을 明(명)히 通(통)하여 眞理(진리)를 깨닫게 됨도 事實(사실)이다. 그러나 現在(현재) 思惟(사유)하고 있는 假我(가아)의 存在問題(존재문제)나 眞理(진리)(太一(태일))에서 비롯하여 이루어진 이 幻有界(환유계)의 秩序(질서)와 原理(원리)까지 通(통)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古來(고래)로 佛家(불가)에서 한 消息(소식) 들었다는 高僧(고승)들의 語錄(어록)을 살펴보면, 本體(본체)(太一(태일), 涅槃(열반))에 대한 說明(설명)은 그럴 듯 하나 現象界(현상계)에 대한 說明(설명)은 實狀(실상)을 벗어나 童話(동화)나 神話(신화) 水準(수준)에 그치고 마는 것이다.
이 問題(문제)는 後面(후면)을 期(기)해 却說(각설)하고, 여하튼 見性(견성)은 太一(태일)을 覺(각)함이다. 그렇다면, 見性(견성)한 이를 보고 ‘太一(태일)에는 무엇이 있는가’라고 물어보면 如何(여하)한가?
世間(세간)에 無數(무수)한 見性者(견성자)들의 對答(대답)을 들어보면 실로 各樣各色(각양각색)이다. 그 중, 좀 더 近接(근접)된 對答(대답)이 ‘아무 것도 없다’라는 式(식)의 表現(표현)이다. 다시 말해서, 絶對境(절대경)에 가보니 부처도 하느님도 眞理(진리)도 그리고 나도, 그 어느 것도 없다는 것이다.
人類(인류)가 切實(절실)하게 찾아 헤매던 저 너머의 彼岸(피안)에, 數百生(수백생)을 거듭하여 비로소 올랐음인데 결국 아무 것도 없다 한다면 이 얼마나 虛妄(허망)할 노릇이 아니겠는가! 아니면, ‘아무 것도 없다’는 말 속에는 覺人(각인)의 그 어떤 深奧(심오)한 뜻이 숨어 있겠거니 하고 그냥 지나쳐 버려야 한단 말인가!
一般的(일반적)으로 形而上界(형이상계)를 論(논)하는 것은 不立文字(불립문자)라 하여 表現(표현)할 수도 없고, 表現(표현)한다 하여도 그 瞬間(순간) 이미 實狀(실상)과는 距離(거리)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形而下(형이하)인 우리의 言語(언어)로 形而上(형이상)의 原理(원리)를 論理的(논리적)으로 說明(설명)하는 것이 絶對(절대) 不可能(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不立文字(불립문자)란 ‘知(지)’와 ‘覺(각)’의 區別(구별)을 말함인데, 이것은 事實(사실)이다. 眞理(진리)를 地積(지적) 次元(차원)으로 理解(이해)한 것과 깨달은 것과는 寫眞(사진)과 實物(실물)을 보는 것과 같은 懸隔(현격)한 差異(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實物(실물)을 直接(직접) 보기 前(전)에는 說明(설명)이 不可能(불가능)하니 寫眞(사진)을 볼 必要(필요) 조차 없다는 式(식)의 主張(주장)은 옳지 않은 것이다.
知的領域(지적영역)은 寫眞(사진)을 보는 것과 같아 設令(설령) 覺(각)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言語(언어)와 文字(문자)로써 理解(이해)하는 것은 可能(가능)한 것이다.
理解(이해)를 못시키는 說明(설명)은 說明(설명)하는 本人(본인)도 모르고 있는데서 基因(기인)한 것이다. 本能的(본능적)으로 어떤 契機(계기)만 생기면 大部分(대부분)이 自身(자신)은 깨달은 것인 양 믿으려고 하고, 그러다가 結局(결국) 自我陶醉(자아도취)에 빠져 事實(사실)인 것처럼 믿게 된다. 그리고 他人(타인)에게 說明(설명)을 함에 있어서 막힘이 생기면 不立文字(불립문자)를 擧論(거론)하며 自身(자신)의 깨달음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다. 眞實(진실)로 깨달은 道人(도인)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못한 衆生(중생)의 立場(입장)에서 그런 式(식)의 모호한 表現(표현)을 쓰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다.
却說(각설)하고, 그렇다면 太一(태일)에 가 본즉 무엇이 있는가?
斷言(단언)컨대 아무 것도 없는 것이 事實(사실)이다. 太一境(태일경)에 沒入(몰입)하고 있는 동안 ‘나’라는 存在(존재)또한 消滅(소멸)되어 그 어느 것도 存在(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存在(존재)가 없다면 이는 唯物論(유물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腦細胞(뇌세포)가 죽음과 同時(동시)에 생각하는 主體(주체) 또한 永遠(영원)히 消滅(소멸)된 狀態(상태)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만약 그러하다면 永死(영사)와 道通(도통)(永生(영생))은 結局(결국) 같은 것으로, 道通(도통)을 위한 人間(인간)의 努力(노력)은 참으로 無意味(무의미)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多幸(다행)히도 단 한 가지 있는 것이 있다. 즉, 消滅(소멸)된 내가 存在(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唯物論(유물론)에서 말하는 完全(완전)히 解體(해체)된 狀態(상태)와는 다른, 아무런 느낌도, 意識(의식)도 없지만 그냥 그렇게 永遠(영원)히 存在(존재)한다는 것, 그것 하나만이 있는 것이다.
이곳은 죽어 있는 곳이 아니다. 엄연히 살아 存在(존재)하고 있음이다. 단지 作用(작용)이 停止(정지)되어 있을 뿐으로, 이곳이 人間(인간)과 萬物(만물)의 根源(근원)인 太一(태일)인 것이다.
그런데 太初点(태초점)이 찍히는 刹那(찰나) 그 餘波(여파)로 인하여 瞬間的(순간적)으로 存在(존재)한다는 것조차 妄覺(망각)하는 狀況(상황)이 發生(발생)하게 된즉, 完全(완전)하고 絶對的(절대적)인 無(무)가 形成(형성)되었음이다. 이것을 이름하여 無極(무극)이라 하는 것이다.
修行者(수행자)들이 가장 넘기 어려운 고비가 바로 이곳이다. 많은 修行者(수행자)들이 無極(무극)에 발을 딛고서는 깨달은 것으로 錯覺(착각)하는 事例(사례)가 頻繁(빈번)하다. 萬物(만물)과 내가 함께 消滅(소멸)된 곳이니 絶對境(절대경)으로 봄직도 하지만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야 함을 銘心(명심)할 지어다.
道門(도문)인 太初点(태초점)이 그대의 無極(무극)에 찍히는 瞬間(순간) 奇蹟(기적)과도 같이 그대는 꿈속에서 깨어나 眞我(진아)와 絶對境(절대경)을 覺(각)할 것이요, 그 瞬間(순간) 그 깨달음도 消滅(소멸)되며 그곳에 永遠(영원)히 틀어박혀 存在(존재)하게 될 것이다. 만약 이 곳에서 나오고자 한다면 깨달음이 消滅(소멸)되기 前(전)에 願(원)을 세울지라. 그 願(원)이 因果(인과)를 惹起(야기)하여 다시 幻有界(환유계)로 돌아올 수 있음이라. 이것이 곧 見性(견성)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精進(정진)하여 絶對境(절대경)에 녹지 않고 自由(자유)로이 出入(출입)할 수 있게 되면 菩薩(보살)이나 神仙(신선)이 되어 現在意識(현재의식)인 假我(가아)를 完全(완전)히 消滅(소멸)하지 않고도 永存(영존)하게 되리니 天地(천지)가 開闢(개벽)하고 宇宙(우주)가 消滅(소멸)되어도 그대는 남으리라.
이것을 이루고자 함이 곧 玉上元聖(옥상원성)님으로부터 仙道(선도)의 法統(법통)을 이어 地上(지상)에 내린 檀儉天子(단검천자)님의 念願(염원)이며, 西方淨土(서방정토)를 天上(천상)과 地上(지상)에 實現(실현)하고자 佛道(불도)를 일으킨 一切諸佛(일체제불)과 菩薩(보살)님들의 한결같은 願(원)인 것이다.
無極太極誰敢言(무극태극수감언)
道通天地無形外(도통천지무형외)
思入理氣交變裏(사입리기교변리)
忽覺天地子心中(홀각천지자심중)
無極 太極을 뉘 敢히 말하는가!
道通 天地가 消滅된 곳(無極)에 있지 않거늘.
한 발짝 더 디뎌 精氣神 合一處를 찻아드소.
忽然中天地가 된 眞我를 覺하게 되리라.
庚午年 聞一하며
'동양학 > 동양철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스크랩] [제6장 象數論] 제1절 象界와 形界의 구분 (0) | 2012.03.09 |
|---|---|
| [스크랩] [第五章 陰陽五行論] 第一節 行의 槪念과 區分 (0) | 2012.03.09 |
| [스크랩] [제1장 태일론] 제4절 정기신 삼위일체 (0) | 2012.03.09 |
| [스크랩] [제1장 태일론] 제3절 태초점 (0) | 2012.03.09 |
| [스크랩] [제1장 태일론] 제2절 태일론 2. 자존체로서의 태일 (0) | 2012.03.09 |